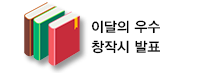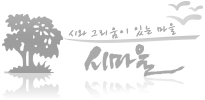낫자루 들고 저무는 하늘 =신용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낫자루 들고 저무는 하늘
=신용목
저 산 산새나 내려앉을 골에 들어 아버지 낫을 놀리시네 달램도 없이 저무는 해 툭툭 나무들 꺾여지는 상처마다 어둠이 신음처럼 피어나는 것을
나는 젋적바위 위에 앉아 바라보네 나무 속의 어둠과 나무 밖의 어둠 나른한 경계에 서는 검은 낫의 비림 갈라지는 바람의 능선에서 어미 없는 나방이 고치에서 풀려날 때 얼굴 없는 기다림아 나는 흔들리는 개망초 시름을 거두러 잃어버린 길로 내보낸 마음 무릎을 모으면 산 그늘이 걸어와 볼을 비비고 가슴을 쓸어 저 먼저 엎드린 마을로 뚜벅뚜벅
한 짐 굽이진 산길 어둠을 받쳐 내려오신 아버지 다시 구들을 지고 앓는 밤 나무들 돌아가듯 연기는 자꾸만 산으로 구부러지고
鵲巢感想文
아버지는 시 객체며 나를 일깨우는 존재를 상징한다. 산은 이상향이며 산새는 산이 품은 어떤 가치겠다. 나무의 음가는 목木이라는 것에서 소리를 상징한다면 나무 속의 어둠은 산속 어둠의 한 자락을 나무 밖의 어둠은 아버지의 어둠이겠다. 개망초와 나방이라는 시어가 시인께서 제공한 문장과 잘 어울려 그 의미가 재미난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개쩐다’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렇다. 분명 국어사전에도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풀 이름 들국화의 일종이다. 그러나 다 망한(皆亡) 풀처럼 시름하는 시적 자아와 잃어버린 길로 내보낸 마음 그것은 어미 없는 나방이 고치에서 풀려날 때 그 얼굴인 모습을 한다. 마을은 내 보금자리가 있는 곳이며 구들은 내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겠지만 구들 어찌 입들로 읽히고 자꾸 피어오르는 연기는 역시 산으로 향하는 마음의 분산이겠다.
언뜻 암중모색暗中摸索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는 뜻으로, 어림짐작(斟酌)으로 사물(事物)을 알아내려 함을 이른다. 미래에 대한 가치 기준은 100% 확신할 수 없다. 현재에 상황을 비추어볼 때 약 70% 확률로 가리는 작업이 없었다면 손은 거두어야 한다. 시간을 쌓는 일은 어느 정도 경험이 밑바탕이 되겠지만, 대세는 분명히 있다. 그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