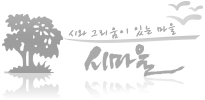내 급여는 작년과 똑같다
[관리소장]은 이명우 시인의 두 번째 신작 시집으로, 「지출명세서」 「관리소장」 「이티」 등 52편이 실려 있다.
이명우 시인은 경상북도 영양에서 태어났고, 2016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달동네 아코디언] [관리소장]을 썼다.
최근 인간이라는 범주와 영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것을 벗어난 세계의 모습을 새롭게 재구성해 보기 위한 진지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시노하라 마사타케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진실한 세계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 모든 지나간 것들이 남긴 ‘흔적’을 강조한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 흔적이야말로 확실성의 유일한 표식이라는 것이다. 시 「각질의 힘」을 비롯해서 이명우 시인의 시집 [관리소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공간이지만 오히려 어떤 흔적도 허용하지 않는 도시의 ‘관리소장’으로 살아가는 시인이 역설적으로 이 같은 ‘흔적’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도시인’이라는 존재의 조건들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이다.
도시의 기능이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지만 정작 그 뒤에 가려져 있던 ‘관리소장’으로서 이명우 시인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은 바로 도시가 거부한 것들의 흔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직장인으로서의 그는 다른 사람들의 “욕설을 넙죽넙죽 받아들”이거나(「욕설의 한 연구」), “변덕이 심한 날씨”처럼 시시때때로 바뀌는 “상사의 지시 사항”을 말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변곡점」). 수직적인 구조와 계약으로 맺어진 종속 관계를 통해서만이 자본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생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신을 포함해 도시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에 끊임없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처럼 현실에서의 쓸모는 이미 멈춘 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각자 나이를 먹지 않는다」). 역사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유물들은 현실에서라면 결국 도시가 지정해 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 있을 뿐이다.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에 시선을 던짐으로써 그 안에 켜켜이 쌓여 있던 삶의 흔적들을 복원하고 있는 중이다.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것들에 새겨져 있는 흔적을 더듬어 가는 시인은 도시의 소음 뒤로 감추어진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 또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잠복기」). 「누가 저렇게 많은 소리를 허공에 매달아 놓았던가」나 「공황장애」, 「물의 길」 등 시집 [관리소장]에서 ‘소리’에 주목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우 시인을 따라 도시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흔적들을 따라가 보는 일이 매력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도시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표를 거부하며 에둘러 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작은 숨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일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해진 시간에는 이미 늦은 채, 도시의 길에서는 벗어난 채로 말이다. (이상 남승원 문학평론가의 해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