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야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본문
야채야!
김부회
사내가 있었다. 채소와 생필품을 작은 트럭에 싣고 섬과 섬 이곳저곳을 다니며 판매하는 이동식 만물상을 했다. 공터가 슬슬 기지개를 켤 무렵 차량 확성기 소리에 고이 춤을 나온 꼬깃꼬깃 지폐 몇 장이 캐러멜 땅콩사탕과 두부와 콩나물과 교환되었고 “깎아 줘!” “어머니, 안 돼요!” 밀고 당기는 흥정과 넉넉한 덤으로 마을회관 앞은 늘 웃음의 북새통이었다.
간혹, 어쩌다 못 다 판 생고사리를 들고 안달할라치면 ‘우리 집에 놔둬 봐! “해풍에 바짝 말려두었다가 사내의 손에 슬며시 쥐여주는 할머니들, 혈혈단신 사내에게 누구나 어머니였고 아무 집이나 사내의 집이었으며 힘에 부쳐 밀어 둔 일은 사내 몫이었다. 볕을 가리는 사립문 밖 나뭇가지를 전지하거나 뒤란의 절구를 부엌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독거노인들의 텃밭을 김매기도 하며 밀물처럼 밀려온 사내는 썰물처럼 뭍으로 빠져나간 노인들의 아들이 되고 섬의 일부가 되었다.
오가는 사내와 그를 기다리는 노인들, 어쩌면 정작 기다리는 것은 외딴섬을 지키며 남아있는 노인들이 아니라 도시라는 거친 바다를 부표처럼 떠돌았던 사내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투박한 사내 얼굴에 배어든 벙긋한 미소가 멈추지 않았고 치부책의 외상값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에 한 번꼴로 섬에 들어가는 새벽마다 섬 주민들의 배달주문 전화가 사내를 신명 나게 했고, 아침 출항을 기다리는 카페리 긴 줄의 맨 앞자리는 트럭 운전석에서 꼭두새벽 쪽잠을 자는 사내의 차지였다. 몇 년 동안.
어느 날, 늦은 점심을 먹고 해거름의 툇마루에서 잠시 졸던 사내의 귀에 “불이야” 소리가 들렸다. 번뜩 일어난 사내는 온통 화마에 쌓여 불타는 트럭을 향해 뛰었고 맨손으로 뜨거운 핸들을 돌려 해안으로 달렸다. 천만다행 사내의 바람대로 주변의 집들까지 불길이 옮겨붙지 않았다. 노후 된 전기장치의 합선으로 이십여 분 만에 홀랑 타버린 낡은 트럭과 생필품들, 잿더미가 된 전 재산의 잔해를 치우기까지 꼬박 이틀이 걸렸다. 노을을 등짐처럼 떠메고 터덜터덜 섬을 나가는 빈털터리, 사내의 맨몸을 위태롭게 지탱하는 기우뚱 등 그림자 뒤로 꼬부랑 어머니와 어머니들의 짠한 울음이 오래도록 섬을 맴돌았다.
삶의 저울추 위에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초로의 사내, 불의의 사고는 사내를 작은 방안에 가두었다. 사람과 사람에서 ‘사이’를 잃은 부연 초점의 눈동자에 스스로 길든 채 우울의 바닥에서 뒹굴었을지도 모를 사내.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칩거의 굳게 닫힌 철문을 활짝 젖히기엔 너무 지쳤고 빈틈을 뚫고 쏘아대는 겨울바람의 살촉은 날카로웠다.
늦겨울 차가운 붓끝이 사선을 긋는 창밖 미루나무, 그 바짝 마른 나뭇가지 중간쯤에 새 둥지 한 채가 겨울의 무채색 풍경을 서둘러 비워 내고 있었다. 환절換節이란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내에게는 다만 시간이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 불과했을지 모르고 그조차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의 하루였을지도 모를 그때, 봄이 찾아왔다. 비와 함께.
바쁜 연두색 물감이 계절을 채록하는 어느 봄날, 섬의 노인들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사내에게 하나둘 전화를 걸었다. "내가 아들 줄라꼬 꿍친 돈 천만 원 있는데 당장 계좌번호 불러봐라! “순간 사내는 한동안 말을 못 했고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허름한 연립주택 꼭대기, 외톨의 옥탑방이 엉엉 울었다. 얼마 뒤 갈매기들 힘차게 날아오르는 해안선을 따라 파란 트럭이 섬과 섬의 이곳저곳을 일주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북적거리는 트럭 앞 ”야채야! “ 정겹게 불러대는 늙은 목소리들과 사내의 해맑은 미소가 복닥복닥 봄을 채근하는 어떤 날.
섬의 나무들은 또다시 뿌리가 힘차게 길어 올린 물을 물관을 통해 가지로 보낼 것이고 꿈을 머금은 여린 잎은 태양 빛을 제 몸에 담뿍 담아낼 것이다. 무성하게 달린 이파리들 사이로 귀환한 새들은 나뭇가지를 물고 와 낡은 집을 보수하고, 어린 알들을 깃에 품을 것이며, 갓 부화한 어린 날개들은 자신들의 하늘을 마냥 날아다닐 것이다.
어머니와 어머니, 섬과 섬이 그를 불렀는지 그가 먼저 섬을 부른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야채 왔어요!” 확성기 소리가 인적 드문 노인들의 하루를 오래도록 지켜주길 바랄 뿐이고, 간혹 가는 귀먹은 우리네 어머니의 은근짜 “달아둬 외상이다!”와 “아이구 어머니! 이럼 남는 것 하나두 없어요” 흥정하는 소리, “담엔 영감 줄 달달한 빵 좀 가져와 뿌라!”라는 무뚝뚝한 말투가 작은 트럭에 넘치게 실리길 바랄 뿐이다. 겨울 다음에 봄이 오고 그 봄이 나무에 잎을 달아주고 초록의 빈 둥지가 새 가족을 맞이할 채비를 하듯, 조물주의 섭리라는 방정식은 서로서로 보듬고 메꿔주는 상생에 그 해법이 있을 것 같다. 행복의 순리는 대상이 무엇이든 더불어 사는 것에서부터 인과관계가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멀리 봄의 씨앗을 가득 품은 산등성이, 잔뜩 휘어진 능선이 촉촉하게 젖은 대지를 향해 과녁을 가늠하다 생명의 팽팽한 활시위를 당기면 이윽고 남녘엔 유채꽃들이 하나둘 노란 등롱을 들고 들판에 불을 지를 것이다. 놀란 백목련이 가리개를 벗어 던지고 우윳빛 망울을 활짝 터트리는 이 땅의 황홀한 소릴 홀로 엿듣는 야산 중턱, 너럭바위에 팔베개하고 달필의 봄이 쓰는 따듯한 아지랑이 서체를 읽는다. “야채가 왔어요!” 해안도로를 따라 돌아가는 구성진 확성기 소리가 졸음의 귓속으로 얼핏 들린 것 같다.
계간 선 수필 2024 봄 호 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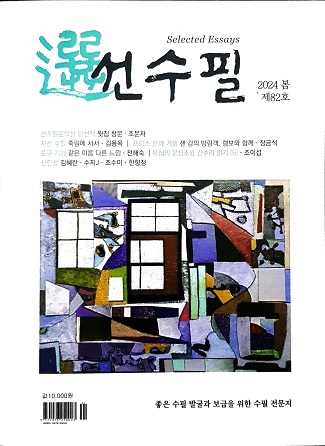

댓글목록
임기정님의 댓글
예전 유희남 작가의 수필 좋아 했어요
오늘 형님의 수필을 읽으며
삶의 향기 바람에 날리어 떠 오르네요
삶이란 이런 것 지지고 볶다 보면
파릇한 향이 나지요
잘 읽었습니다
金富會님의 댓글의 댓글
고맙습니다
임기정 시인님...^^
다양한 글을 써보려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건강하세요





